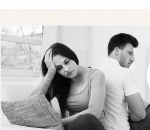한국에서의 일이다. 1984년, 한 모임에서 백인 대학생을 만났다. 남 · 여 두 학생은 백인 특유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훤칠한 키로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는지, 아니면 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다정다감하고 순수한 청년으로 기억한다. 서로 긴밀해지며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해 여름 로스앤젤레스에서 제 24회 하계올림픽이 열렸기에 그 얘기부터 꺼냈다. 당시 우리나라 여자농구팀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대번 나는 “그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NO’였다. 아니 이럴 수가? 마음이 상했다.
센터 박찬숙을 중심으로 여자농구팀은 어마무시한 서양 팀들을 물리치며 기대이상의 눈부신 활약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승에서 세계 최강 미국에 55-85로 졌지만 여자 핸드볼과 함께 올림픽 구기 종목 사상 첫 은메달을 따냈던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라는 사실을 ‘대단하다.’고 소리를 높였는데 정작 개최국에서 온 미국 학생들은 관심도 없었다. 아마 내가 아직도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그들에 대한 오해를 지우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안다. 미국사람들은 우리처럼 정치나 스포츠에 그리 큰 관심이 높지 않다는 것을.
가장 궁금한 것은 말로만 듣던 돈을 세는 방식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손에 침을 뱉아 앞으로 당기며 돈을 센다. 백인들은 다르다는데? 옆에 서있던 사람에게 돈까지 빌려 한 다발을 그들 손에 쥐어 주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돈을 옆으로 잡는다. 이내 옆으로 비벼가면서 카운트를 했다. 참 신기했다. 이번에는 글씨를 쓰게 했다. 모든 면에 우월해보이던 그들의 모습에서 반전을 경험했다. 그건 글씨가 아니었다. 실로 ‘개발세발’ 지렁이가 기어가듯 흘려 쓰는 글씨체에 절로 웃음이 지어졌다. 누군가 그들 편을 들며 말했다. “미국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 자판에 익숙해서 글씨는 잘 못쓴답니다.”
그런데 요사이 내가 글씨 쓰기를 싫어하고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글씨를 배웠다. ‘꾹꾹’ 눌러서, ‘또박또박’, 국어공책 네모 칸에 가득 찰 정도로 큼지막하게, 이것이 처음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글씨를 쓰는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명필이셨다. 한문도 한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마치 인쇄해 놓은 듯 정말 글씨를 잘 쓰셨다. 그것도 유전일까? 아버지 글씨체를 흉내내다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명필이 되었다. 아버지의 글씨체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나와 친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글씨를 잘 쓰는 지 다 안다. 덕분에 고교시절부터 펜팔을 통해 인기를 누렸고, 많은 분홍빛 사연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글씨가 쓰기 싫다. 나는 20대 유년주일학교 전도사시절부터 직접 펜으로 설교를 작성하였다. 내가 직접 쓴 설교원고를 가지고 단에 올라야 영감이 풍성해 지는 듯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원고를 프린터로 출력해서 설교를 하면 꼭 남의 설교를 하는 듯이 뭔가 어색했다. 하지만 자꾸 하다 보니 역시 편하고 좋았다. 속도도 빠르고, 활자모양,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다 칼라까지 입힐 수 있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매주 칼럼을 쓰다 보니 이제는 자판이 훨씬 편해졌다.
나는 아직도 다이어리를 직접 쓰며 일정을 관리한다. 그런데 글씨 쓰는 것을 보면 성의가 없다. 거의 흘려 쓰는 글씨가 많다. 그러면서 스스로 변해버린 나 자신에 놀라고 있다. 과거 손 편지를 쓸 때는 생각도 많이 하고 표현하기 힘든 것을 글로 전하는 희열도 느꼈었는데 말이다. 그러면서 불현 듯 30여 년 전에 만났던 백인 학생들이 생각났다. 사람은 훈련의 동물인가보다. 편해지면 더 편해지려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 같다.
고교를 졸업할 때에 아버지가 선물해준 만년필을 마치 금덩이 모시듯 귀중히 여기며 글을 쓰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힘은 들지라도 내 손끝에서 나오는 글씨가 내 인품이요, 내 인생이기 때문이다. 글씨에 내 인격을 새기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