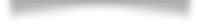팬데믹을 지나며 놀라는 것은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것이다. 차 운행이 필수인 미국에서 개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인들을 만나 식사를 할라치면 음식 가격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런치 스페셜?’ 옛날이야기이다. 저렴한 스페셜이 아니라 ‘비싼 스페셜’이라 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식당은 문전성시이다. 앓는 소리를 하지만 다들 곳곳에서 만나 식도락을 즐긴다. 사람은 만나야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돈독해 지기에 먹는 즐거움을 억제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어린 시절,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던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항상 머리에 수건을 두른 이유는 아마 덤불이나 잿가루가 머리에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얼마 후, 석유 곤로가 나왔고, 밥을 짓는 일이 조금은 수월해 졌다. 하지만 심지를 돌려 올리고 안을 들여다보며 본체를 살짝 들고 심지에 불을 붙이는 일도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드디어 전기밥솥에 시대가 열렸다. 1975년에 일제 ‘코끼리표 밥솥’이 출현했는데 가격이 15만원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초임교사 한 달 월급이 3만원이었으니까 웬만해서는 장만하기 힘든 가전제품이었다. 아줌마들이 계를 부어서 일본에서 사올 정도로 코끼리 표 전기밥솥은 주부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이제는 한국 밥솥이 Top이라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내가 자랄때는 놀거리가 없었다. 산과 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노니는 필드였고, 온갖 자연이 우리의 장난감이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놀던 그때가 그립다. 저녁때가 되면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몽실몽실 피어오르고, 밥 냄새가 온 동네에 번져간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 “재철아~ 밥 먹어라!” 일제히 놀이를 중단하고 집으로 향한다. 그때 우리에게는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고, 명절이 되어야 그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이제는 당뇨가 두려워 흰쌀밥을 먹으려면 몸이 움추러드는 시절이 왔다.
아내는 모마트에 가서 “그 쌀만 사오라” 한다. 내 눈에는 그 쌀이 그 쌀 같은데 말이다. 요사이 쌀에는 돌이 없다. 옛날에는 그 돌을 걸러내느라 몇 번이나 조리질을 해서 앉혀도 불안했는데 이제는 대충 씻어 물만 잘 맞추어 놓으면 맛있는 밥이 만들어 진다. 밥이 다되면 흘러나오는 말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으니, 밥을 잘 저어주세요” 멘트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진정 “친절한 밥솥씨”이다. 그 말대로 잘 젓고 난 후 주걱에 붙어있는 밥알을 입에 머금으면 구수하고 쫄깃하게 씹히는 밥알에서 남 모를 행복감이 찾아든다.
반찬은 아무리 맛이 있어도 계속 먹으면 질리지만 밥은 여전히 맛이 있는 것이 신기하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우리가 먹는 차진 밥을 만나기 어렵다. 날아갈듯한 밥알을 국을 마시듯 입안에 털어 넣어야만 한다. 그래서 아내는 밥을 지을때면 찹쌀을 적당량 혼합을 한다. 지혜롭다. 나는 어릴 때 외간장에 밥을 비벼 김치를 쭉쭉 찢어 얹어 먹는 것을 좋아했다. 나중에는 날계란에 비볐는데 비릿한 냄새가 밥과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웠다.
한국에 가면 가끔 지인들이 한정식을 대접해 준다. 수십가지 반찬이 나오기에 놀라기도 하지만 기명이 놋그릇이어서 마치 임금님 수라상을 받은 것 같다.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윤기 흐르는 밥이다. 자르르한 기름기가 흐르는 밥이 군침을 삼키게 만든다. 그렇게 맛있는 밥을 배부르게 먹고는 따뜻한 숭늉을 만들어 마시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그렇다. 밥상의 주인은 밥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밥은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밥에 따라오는 반찬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좋은 쌀로 밥만 맛있게 지으면 반찬이 좀 빈약하면 어떠하랴? 반찬은 찬(餐)일뿐, 역시 밥상의 주인은 밥이다. 밥상이라고 하지 반찬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우리 조상들은 “밥이 곧 하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인 시대를 지내야만 하였다. 아버지는 밥을 남기는 일을 몹시 싫어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공기를 싹싹 긁어 마무리를 한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건강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밥이 곧 하늘이라는 말일 것이다.